반응형
장수양 <손을 잡으면 눈이 녹아>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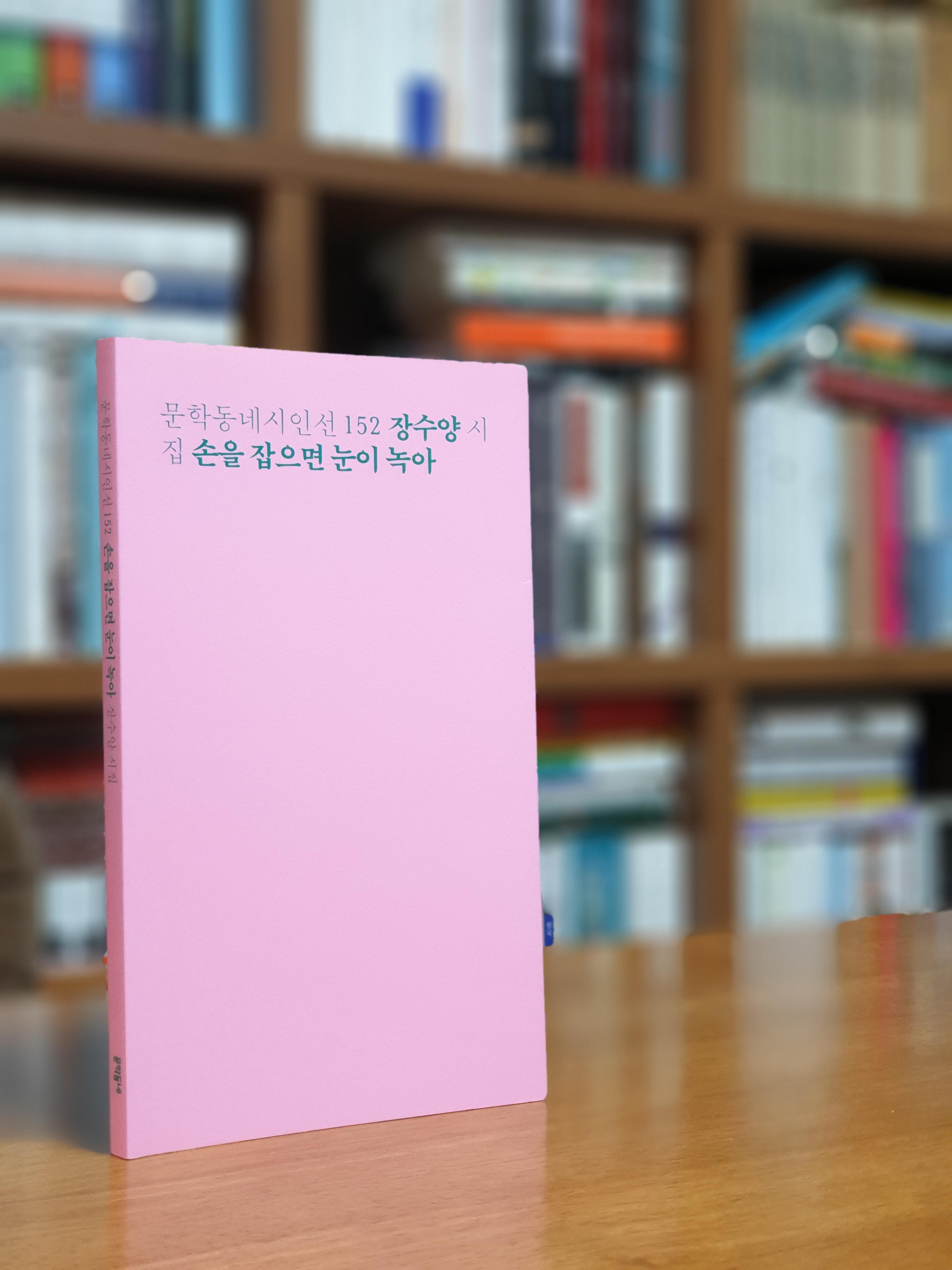
<손을 잡으면 눈이 녹아> 장수양 시집에서 남기고 싶은 시
p. 20~21
연말상영
손을 잡으면 눈이 녹아.
극장에서는 그래.
스크린 향이 있다는 걸 아니. 기묘한 냄새야. 우린 쿠션달린 의자가 아니라 계단에 꿇어앉아 있는 것 같아. 한 칸씩 낮아지거나 높아지면서. 누군가는 나의 정수리를 내려다보고 아래 있는 머리들은 볼링공처럼 보이네. 밀어내면 멀리 굴러가버리는 것들.
엔딩크레디트가 끝없이 올라가는 티셔츠를 입고 싶어.
영사기의 불빛을 내 목젖과 눈꺼풀 위까지 쐬어도 좋다.
이상하지. 불 꺼진 거리에서 너의 이름을 읽는 일은 왜 언제나 어려울까.
너는 어두울수록 맑아지는 게 있다고 했지만 나는 컴컴한 공간에서 매번 어리숙했다. 숨쉬는 걸 잊어버려서. 나중에는 귓가에 다른 사람의 숨소리가 닿는다고 생각했다. 그러자 나는 어둠 속에 하얗게 떠오른 너의 얼굴을 볼 수가 있었다. 이런 걸 사람들은 시네마라고 부르는 걸까.
다리와 팔이, 뜨거워서 만질 수 없는 가슴이 얼굴이 녹아버리고
그렇게 공중에 떠올라도 좋다. 발을 바닥에 붙이고 있으면, 누가 바라봐주나?
자전하면서 없어지는 불빛들
나는 누굴 만졌던 손끝을 기억하고 만다.
모두 떠나고 나면
흐트러지는 공간으로서 눈뜨는
어둠이 있어
사라지는 눈사람처럼
시간은 처음의 모습으로 반짝이기 시작한다.
p. 113~115
언니의 밤
어제는 해가 뜨지 않았다
네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언니가 말했다
기쁘지는 않았다
내 소원은 항상 차선책이었다
우리는 이 신기한 일에 대하여 일기를 쓴다
나는 문장을 쓰고 언니는 그것을 소리내지 않고 읽는다 말하면 사라지는 문장을 우리는 알고 있다
오늘은 힘든 일이 많았고
여전히
물과 잠은 달다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안전하다
배고파, 추워 같은 말을 무시코 하기는 싫어
사랑해, 좋아 같은 말은
죽어도 입에 안 익지
우리도 안다
매일매일은 사랑할 수 없지
눈을 뜨면 더이상 눈뜨지 않아도 된다
부리 없는 새처럼 언니가 조용히 말한다
밤을 보내고 나면
많은 것을 잊어버리지만
내가 밤이 되면
밤에 일어나는 일들을 소유할 수 있어
새는 새의 영역에서 죽거나 살지
검은 눈꺼풀을 바라보며 나는 쓴다
몸에 일어나는 보풀을 만져본 적이 있다
전혀 부드럽지도 않고
질 나쁜 카펫 같았다
슬픈 감각을 학습할 때
만져보면 좋겠어
나는 두번째
언니는 나의 두번째
우리는 위험한 처음으로부터 안전하다
우리는 소원 살해의 피의자다
어느 쪽도 범인이 되지는 않는다
언니에게 보내고 싶은 사랑은
어젯밤의 사랑이고
언니를 미워하지 않으려는 마음은
비밀이 된 밤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한번
사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하지만
어느 쪽도 방법을 모른다
해가 뜨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는 흰색과 검은색을 모두 공간이라고 불렀다
우리는 어디든지 있을 수 있었다
그리고 언니는 언니가 되지 않아도 괜찮았다
p. 120~121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된다
벤치에 앉은 사랑은 팔다리를 축 늘어뜨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를 신경쓰지 않았다 간혹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혐오하는 사람도 있었다 조명하지 않아 어두운 인도였다
나는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고 여기에는 왜 아무것도 뛰지 않는가.
통증만이 오롯한가, 그가 어디 있든 열렬할 텐데
나의 한 켠의 죽어 있음이 다른 한 켠을 증명하는 듯하여 마뜩치 않구나.
태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사랑의 발끝에 매달리던 구두가 툭툭 바닥에 떨어졌다 왼쪽부터인지 오른쪽부터인지 모르겠으나 리듬은 알맞았다 정수리도 아닌 위치에 사랑의 신을 붙이고 아스팔트는 여전히 공허했다
당신이 어디 있든 열렬할 텐데
운동장만한 사람의 얼굴이 큰 소리로 깜빡이는 듯했다
벽이 없었으므로
나는 한 번도 무릎 꿇지 않았다
눈감으면 황소자리의 어둠이 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를 대비해야 했다
그뿐이었다
반응형
BIG
'북리뷰 > 문학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시] [그 세계의 말은 다정하기도 해서] 박숙경 시집 (35) | 2022.03.10 |
|---|---|
| [시] [공항철도] 최영미 시집 (24) | 2022.03.09 |
| [시] [우리가 동시에 여기 있다는 소문] 김미령 시집 (15) | 2022.03.07 |
| [시] [무구함과 소보로] 임지은 시집 (16) | 2022.03.05 |
| [시] [찬란] 이병률 시집 (30) | 2022.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