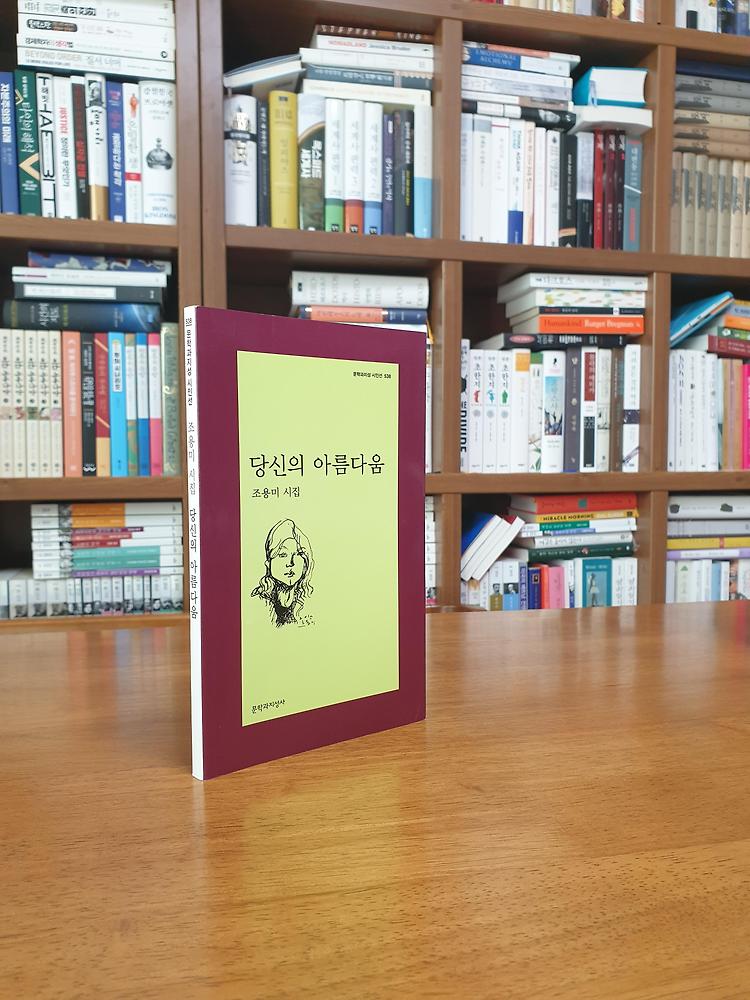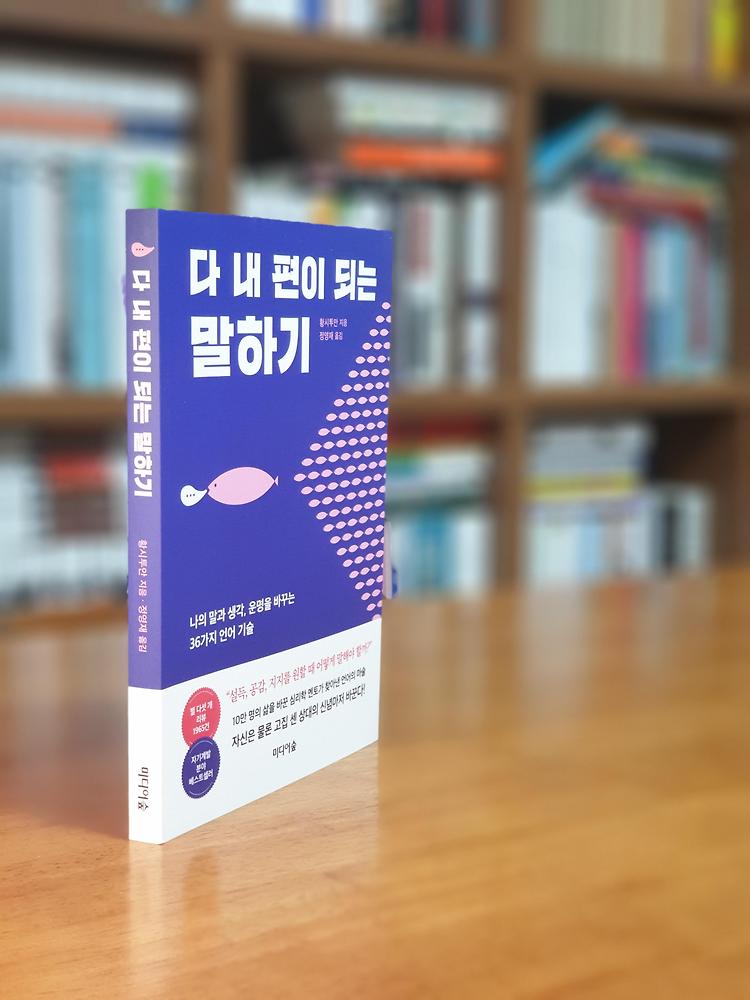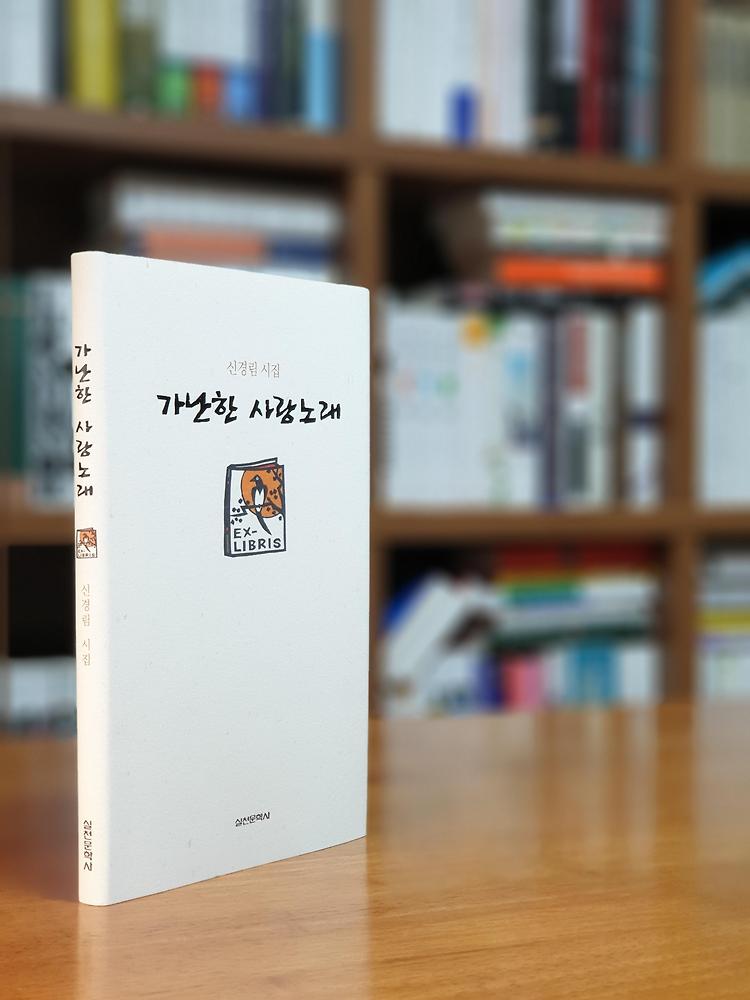김용택 2021 김용택의 사랑시 모음 김용택 시인이 자신의 시 중에서 사랑시를 모아 정리한 시집이다. 최근 작품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김용택 시인이 직접 찍은 사진들이 시집 곳곳에 들어있다. p. 20 파장 네 마음 어딘가에 티끌 하나가 떨어져도 내 마음에서는 파도가 친다 p. 23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이 밤 너무 신나고 근사해요 내 마음에도 생전 처음 보는 환한 달이 떠오르고 산 아래 작은 마을이 그려집니다 간절한 이 그리움들을 사무쳐오는 이 연정들을 달빛에 실어 당신께 보냅니다 세상에, 강변에 달빛이 곱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흐르는 물 어디쯤 눈부시게 부서지는 소리 문득 들려옵니다 P. 26 인생 사람이, 사는 것이 별건가요? 눈물의 굽이에서 울고 싶고 기쁨..